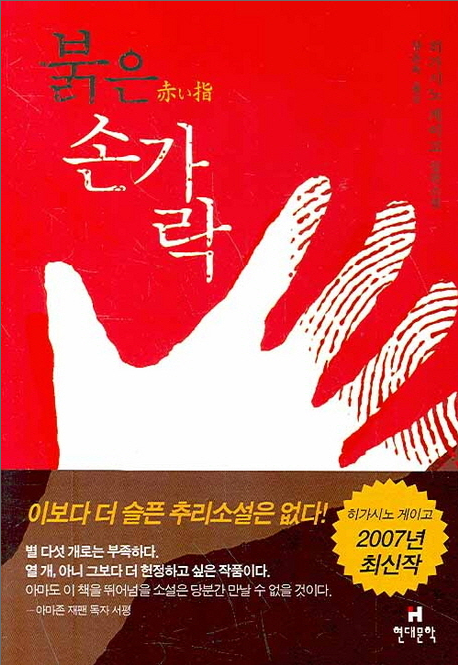↑'언어의 7번째 기능'의 서적판 링크
이 글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소개:
「누가 롤랑 바르트를 죽였나?」
롤랑 바르트의 죽음과 그의 품에서 사라진 괴문서.
사건과 얽힌 당대 최고 지성인들의 민낯을 만나다.
선을 넘나드는 당돌한 글쓰기가 돋보이는 지적 팩션.
프랑스의 저명한 기호학자이자 문학 비평가 롤랑 바르트.
그는 1980년에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 갔다가 이내 사망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하지만 그게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면?
사고 직전 롤랑 바르트가 괴력의 비밀문서를 지니고 있었다면?
그 비밀문서에 세상을 뒤집을 만한 힘이 있었다면?
이를 차지하기 위한 음모의 배후에 거대한 비밀 조직이 있었다면?
다혈질 수사관 자크 바야르와 풋내기 기호학자 시몽 에르조그가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 움베르토 에코 등 20세기 최고의 지성들 사이에서
롤랑 바르트의 죽음과 괴문서를 둘러싼 수수께끼를 파헤친다.
처음에 소설이 아니라 그냥 자기계발서인줄 알고 집었다;;
위에 적힌 책 뒷 편의 소개를 읽고 골랐어야 했는데...
독서가가 책을 집었으면 끝까지 읽어야지! 하고 읽어 보았다.
'언어의 7번째 기능'은 「누가 롤랑 바르트를 죽였나?」라는 부제목을 출발점으로 시작한다.
처음 이 책을 읽으면서 소설인지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살짝 당황 했었지만 부제목을 중심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자 이내 읽히기 시작했다.
현실의 롤랑 바르트는 소설의 바르트처럼 1980년 2월 25일 파리에서 트럭에 치이고 3월 26일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여기까지가 진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 외의 이야기는 전부 '언어의 7번째 기능'이라는 소설이다. 작가는 롤랑 바르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음모가 있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린 바르트, 움베르코 에코, 미셸 푸코, 솔레르스-크리스테바 부부, 자크 데리다 등등 책을 펼치면 나오는 가장 첫 장에는 프랑스와 미국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거기에 더불어 프랑수아 미테랑과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같은 정치가까지 연달아 나온다. 작가는 현실의 인물의 이름과 직함을 빌려 작가의 마음대로 소설을 구성한다. 현실의 인물을 쓰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소설인지 헷갈릴 수 있다. 가상의 인물들은 주인공인 바야르 형사와 '통역사'인 시몽, 아메드 같은 첫 장에서 알려주지 않은 인물들이다.
우선은 언어의 7번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에 의하면 언어에는 여섯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한다. 지시적 기능, 감정표현적 기능, 능동적 기능, 친교적 기능, 메타언어적 기능, 시적인 기능이다. 하지만 야콥슨은 여기에 언어의 7번째 기능이 있다고 했다. '마법 혹은 주문적인 기능'이다. 미국의 철학자인 존 오스틴은 이 기능을 수행적 기능이라고 했으며 "발화와 동시에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공식으로 요약 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면 영주가 "당신을 기사로 임명한다"라고 말함으로써 기사를 서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소설 속에서 바르트는 언어의 7번째 기능을 손에 넣었다가 그 기능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살해당했다. 움베르트 에코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 에코는 언어의 7번째 기능의 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기능을 알게 된 사람, 그것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 힘은 무궁무진 할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군중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며 혁명을 일으키고 여자를 유혹하고 ... 원하는 건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바르트의 문서를 노리고 지스카르, 미테랑, 불가리아인, 아나스타샤, 일본인, 바야르, 시몽, 크리스테바, 솔레르스 등등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섥힌다. 이 사람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스카르가 고용한 바야르와 시몽, 바르트의 일본인 친구들, 그리고 아나스타샤가 한 그룹이고 나머지 한 그룹은 크리스테바-솔레르스 부부와 그들이 고용한 불가리아인들이다.
개인적으로 언어의 7번째 기능은 내 취향과는 정반대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성적인 묘사들, 실존 인물들을 소설이라지만 경멸하게 만드는 설정들, 2004년에 세상을 뜨는 데리다가 1980년 개한테 물려 죽게 만드는 일, 어렵지 않은 말을 어렵게 빙빙 돌려 쓰는 등... 여러가지로 마음에 안들었다. 하지만 작품성으로 따지자면 훌륭했다. 기승전결이 확실했고 무엇보다도 '통역사' 시몽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독자들한테 통역을 해주는 점이 특별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처럼 허무한 엔딩을 보는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지만 언어의 7번째는 그런거 없이 확실한 엔딩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떼우기에는 좋다.
당직을 서면서 읽기에 정말 좋았다.
아한의 평점: ★★★☆☆